현장의 소리 - 학생들을 통해 배우는 삶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28 오후 16:46:11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4주간의 교직실습을 했다. 임상실습과 더불어 교직실습은 더더욱 간호과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가다듬게 만든다.
실습 첫날 아침,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모습은 왠지 모를 대견함과 뭉클한 감정을 내게 주었다.
학교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혹은 교정에서 마주칠 때와는 사뭇 다른 의젓함과 긴장감 그리고 뭔지 모를 기대감이 그들에게 조심스레 깃든 그런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에서까지 풋풋한 신중함이 묻어났다.
항상 어린아이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아이가 입학식 날 의젓한 모습으로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듣고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나 할까. 매년 교직실습 기관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이렇듯 기분 좋은 신선한 충격을 내게 던져주곤 한다.
미혼인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제 조카가 요즘 너무나도 예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맛에 아이를 키우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이런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세상을 하나씩 배워가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학생들과 생활한지도 올해로 13년이 되어 간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딸, 귀한 아들일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임해온 나는 얼마나 신중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왔는지 자문해 본다.
교직실습 중 보건수업을 한 후 학생들에게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여러 번 수업을 하니까 조금씩 긴장감이 줄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교직실습을 마치며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경험담을 들으면서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이듯 학생은 교육자의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다.
반복되는 강의로 인해 강의준비에 대한 나태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성의 없이 임해서는 안 될 고귀한 교직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의 생생한 교직실습 체험담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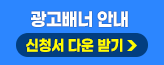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