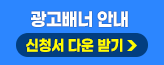[칼럼] 한 번 간호사면 영원히 간호사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6-02 오후 18:24:38

유분자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
◇ 한 번 간호사면 영원히 간호사
나는 생일이 두개다. 정말이지 그런 각오로 줄곧 살아왔다.
첫 번째, `생물학적 나이'는 올해가 팔순. 가끔 장수가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전히 생각이 많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나이'다. 딱히 그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냥 지어봤을 따름이다. 1968년 12월 12일. 생전 처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날이다. 하루 전 떠난 한국은 마침 동장군이 기습공격을 해와 온통 얼음 공화국이 돼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는 거의 초여름 날씨. 야자수가 살랑거리고 있어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몇 번씩 되뇌이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하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어져 살다' 곧 이주민을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그때 간호사들이 해외이주를 할 수 있었던 곳은 서독 뿐.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민개혁으로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에게도 미국이민 문호가 열렸다.
그래서 `루프트한자' 대신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린 것이다. 남편과 두 아이를 서울에 남겨둔 채 트렁크 하나만 달랑 들고. 그러니 `디아스포라 나이'로는 올해 47세를 맞는 셈이다.
가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유행가 가사를 읊조린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내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내게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늘 디아스포라 나이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면 초심으로 되돌아가 힘이 불끈 솟는다. 시계바늘을 68년 당시로 되돌리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간호사대회 및 재외한인간호사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300명을 헤아린다.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유명대학에 적을 둔 교수들과 정부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트 간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중 상당수가 1.5세와 2세들이다. 특히 1.5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미 은퇴기에 접어든 1세와 현지에서 태어난 2세를 아우르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서 처음 근무한 텍사스엔 `한 번 텍산이면 영원히 텍산(Once a Texan, Always a Texan)'이란 말이 있다. 어디에 살든 텍사스에서 태어났으면 영원히 텍산이란 뜻이다.
나는 `한 번 간호사면 영원히 간호사(Once a Nurse, Always a Nurse)'란 신념으로 살아왔다. 출생지, 출신학교 가리지 않고 간호사들의 미국 정착을 도와주려 애썼다.
아무리 그래도 생물학적 나이는 거스를 수 없는 법. 머지않은 날에 있을 내 장례식에 누군가가 `유분자는 죽어서도 간호사'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대학병원(UC어바인 의대)에 시신기증을 약속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