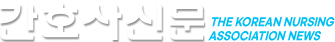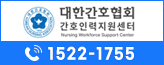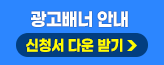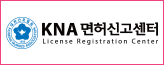[칼럼] 간호사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12-16 오후 13:02:26

◇ 간호사 근무환경 외면하는 현실 환자안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뉴욕 병원의 ‘리비’ 사망사건 계기 전공의 근무시간 사회이슈로 떠올라
제 딸 아이가 여섯 살이니까, 6년 전의 일이겠지요. 당시 아내는 임신 37주였는데,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실로 입원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모교에서 수련 받았지만, 막상 환자로 그것도 경험이 별로 없던 산부인과병동에 입원하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만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는 척’을 합니다. ‘조동찬 선생님, 얼마만이야? TV에서는 잘 보고 있어.’ 당시에 기자 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 사실 TV에는 가뭄에 콩 나듯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일 때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분이었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와 중환자실 간호사,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곱던 밉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분만실이 내 집처럼 편해졌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주일 전, 그 때는 1주일 후에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9개월 동안의 투병 기간 동안 5곳의 병원을 경험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병원과 가장 불편했던 병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곳은 A병원이라고 합니다. A병원은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의료진의 자존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의 회진 횟수도 다른 병원보다 많지 않고, 의사에게 시시콜콜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선정 이유는 달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웃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까다로웠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은 잘 웃고 그 만큼 친절했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불친절이 아니라 웃음 때문이라는 건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절하게 웃는 모습은 다른 병원과 비슷한데, A병원의 간호사들은 지쳐 있었어, 그래서 불편했어.”
웃음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암 환자에게는 자신을 향한 웃음이 생동감 있는지, 아니면 지쳐있는지 선명하게 구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병동 간호사는 3교대 근무만으로도 힘든데, 중환자가 많은 해당 병원의 특성상 간호사의 업무는 다른 병원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 지친 웃음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최근 들어 대학병원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문제는 전공의의 인권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닙니다.
1984년 ‘리비’라는 18세 여대생이 낮에 치과에서 이를 뽑았는데, 밤부터 고열이 나서 부모님과 함께 뉴욕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인턴 선생님이 바로 관찰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새벽 3시30분쯤 리비가 추워서 떨자, 인턴 선생님은 ‘데메롤(마약성 진통제)’을 투여합니다. 이 약은 떨림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고열로 추워서 떨 때 쓰는 약은 아닙니다. 이 주사를 맞고 리비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자 인턴 선생님은 리비를 침대에 묶고, ‘할돌’이라는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리비의 체온은 42도까지 오르고 결국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인턴 선생님은 당직 내과 전공의 2년 차에게 보고했습니다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리비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인턴과 내과 2년 차 전공의 대신 뉴욕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인턴 선생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날 담당해야 할 환자가 리비 외에 40명이나 더 있었고, 내과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제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전공의 근무환경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간호사 근무환경의 문제가 나아지기는 아마 더 어렵겠지요. 그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친 웃음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웃음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