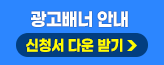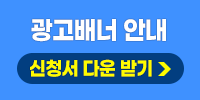백의춘추-조국에 바친 꿈
김은주(서울보훈병원 간호사)
[서울보훈병원] 김은주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6-22 오전 10:33:27
푸른 6월의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날을 차마 잊을 수 없어 추도라도 하듯 하늘이 청정하기만 하다.
아픈 몸 이끌고 오늘도 병원에 들어서는 김 씨 할머니. 얼굴에 패인 주름이 깊은 골이 되었지만 아직도 애절한 꿈은 놓지 않으신다. 80평생 늘 변함없는 한 가지 소원은 전장에 나간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꿈을 수줍은 새색시처럼 갖고 계신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끼니 때마다 남편 몫으로 밥 한 사발을 더 짓는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딱히 거들어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깝다. 어떤 때는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이 그분들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싶어 간간이 목안이 젖어들기도 한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할머니의 장아찌처럼 졸여진 세월과 안타까움에 거친 손만 잡아드릴 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목숨을 바쳐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이들이 지금 시대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살면서 지나간 것은 너무 쉽게 망각한다. 현실의 안이함만 찾을 뿐 뒤를 돌아보는 것을 아예 거추장스러워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지기까지 분명 아까운 목숨들은 전선에서 피를 흘렸다. 대를 잇기 위해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고 바로 전쟁터로 나가는 바람에 김 씨 같은 할머니는 한평생 남편을 기다리며 한숨으로 사셨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헤아리기는 커녕 아예 존재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으니 국가 유공자들 가족의 가슴은 생채기 투성이다.
병동에서 만나면 오히려 우리들한테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국가 유공자 분들. 그 분들을 대할 때면 마음을 다잡아도 눈언저리가 축축해지곤 한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국민 모두가 이 달 만이라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아직도 정화수를 떠놓고 전쟁터에 나가 소식 없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미망인들. 그 손은 견뎌 온 세월만큼 쭈글쭈글해지고 울퉁불퉁해졌다. 그간 가슴에 맺힌 한이야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까. 세월 풍파 속에 아픔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그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나 남편을 만나 회포를 풀게 되리라.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2006년 유월 하늘이 여느 해보다 푸르다. 월드컵 승리도, 미망인들의 꿈도 다 이루어질 듯 하늘이 더욱 푸르게 느껴진다.